Recent Posts
Recent Comments
주간 정덕현
아버지 머리의 뿔은 왜 자랐을까 본문
728x90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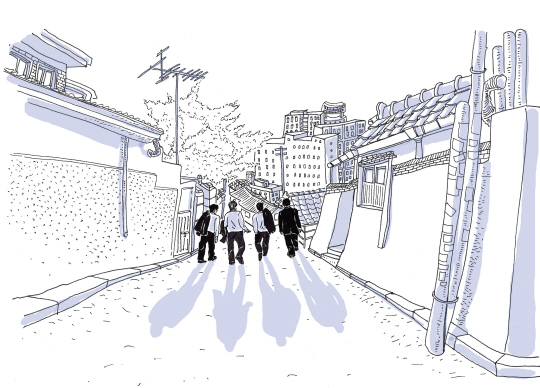
시골에 갔더니 아버지께서 불쑥 이 얘기부터 건네셨다. 사실 조금 부끄러웠다.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뭔가 속내를 들킬 때 어색해하는 감정이 남는 모양이다. 그래도 아버지는 내 속내가 궁금했던지, 책이 나왔다고 하니 단박에 책을 구해서는 읽었다고 하셨다. 책상 위에 놓여진 책은 접어가면서 보았는지 벌써부터 너덜너덜해져 있었다.
사실 시골 내려가기 전에 어머니가 전화를 했었다. "얘. 네 아버지가 이상하다." "네? 어디가 편찮으세요?" "아니 그런게 아니고 네 책을 읽으면서 깔깔깔 웃다가 또 갑자기 울고 그런다지." 아들이 책을 쓴 것에 대한 과장이겠거니 했다.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내게 그렇게 얘기하니 마음 한 구석이 짠해졌다. 초등학교 때 서울로 온 후, 줄곧 단 한 번도 함께 지낸 적이 없는 아버지와 나는 그만큼 속내를 얘기하며 소통한 적이 없었다. 3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책 한 권으로 서로의 마음이 만나게 된 것이었다.
책에 '아빠가 뿔났다'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면서 나는 사실 조금 울었던 것 같다. 도대체 얼마나 아픔을 속으로만 삼켰으면 실제로 머리에 뿔이 날까, 하는 그 생각 때문이었다. 그러면서도 매번 볼 때마다 "난 괜찮다"고만 하셨던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. 그 마음을 알면서도 말로 그걸 표현하기에는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 있었다. 그래서 대신 한 자 한 자 글로 그걸 적어나가면서 나는 의식적으로 아버지가 이 글을 읽기를 바랐던 모양이었다.
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푸념하시는 걸 거의 보지 못했다. 물론 연세가 드시다 보니 마음이 약해지셔서 점점 과거와 달리 푸념을 하시지만 그래도 젊었던 시절에 아버지는 거의 모든 당신의 말을 아꼈다. 뿔은 거기서 생겨난 것일 거라고 나는 상상했다. 밖으로 풀어냈어야 할 그 가시 같은 말들을 그저 꿀꺽 꿀꺽 삼켜버린 아버지는....
“아빠는 괜찮다.”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던 아버지의 이 말이 이제는 새롭게 들린다. 정말 아빠는 괜찮았던 것일까. 왜 ‘아빠도’가 아니고 ‘아빠는’이었을까. 혹 힘겨운 삶 저편에서 실은 괜찮지 않은 삶을 살고 계셨던 건 아닐까.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. 아버지. 그렇게 괜찮다고만 말고 화라도 내보세요. 속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나 스스로도 다짐한다. 절대로 가족들을 위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저 “괜찮다”는 말만 반복하는 그런 삶은 살지 말아야지. 그러다 어느 날 불쑥 내 머리 위에 뿔이 솟아날 지도 모르는 일이니까. 혹 그 뿔을 보는 가족 중 누군가가 뒤늦게 가슴 아픈 마음을 갖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니까. - '숨은 마흔 찾기' 중에서
서울로 돌아오기 위해 집을 나서 차를 몰고 나오는데 저 뒷편에 아버지가 보였다. 아버지는 아주 멀리 차가 멀어질 때까지 거기 서 계셨다. 입가에 희미한 웃음을 드리운 채. 혹 지금도 그 뿔은 여전히 자라고 있는 건 아닌지.
'옛글들 > 스토리스토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제 점수는요... 합격! 두근두근 쿵쿵! (0) | 2011.03.28 |
|---|---|
| 때론 고립을 즐기자 (0) | 2011.03.14 |
| 병수야, 마흔이 무슨 죄니? (0) | 2011.01.25 |
| '무한도전'과 '1박2일' ㅣ 감동만큼 큰 재미는 없다 (0) | 2011.01.17 |
| '시크릿 가든' ㅣ희비극은 하나다 (0) | 2011.01.10 |




